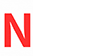한국인과 일본인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빨리빨리(はやくはやく, 하야쿠하야쿠) 문화(ぶんか, 붕카)’와 ‘정확(せいかく, 세이카쿠), 완벽(かんぺき, 간뻬끼) 문화’다.
우리나라는 대충대충 하더라도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일본은 늦더라도 정확하고 완벽한 일처리를 바란다.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가장 속 터지는 일이 일본의 ‘느릿느릿’ 문화다. 그중 단연 1위는 관공서와 은행 업무 처리 속도다. 무엇이든 빨리빨리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관공서와 은행 업무 처리 속도를 보면 한숨이 나오곤 한다.
한국과 같은 인터넷 민원 처리 시스템은 아예 없고 이사를 하게 되면 각 구청((區役所, くやくしょ, 구야쿠쇼)에서 전입신고를 바로바로 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待(ま)ち時間(じかん),마찌지칸)이 상상을 초월한다. 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계좌 개설 후 1주일이 지나야 카드가 집에 도착하는데, 그 카드를 등록하고 1주일이 지나야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카드를 다시 보내준다.
일본인은 일(ものごと, 모노고도)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ちゃくじつに, 짜쿠지쯔니) 진행시키려는 사람이 많다.

일본인은 완벽주의자(完壁主義者, かんぺきしゅぎしゃ, 간뻬키슈기샤)가 많다. 물론 이런 성격에도 문제점은 적잖다.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식과 타협(妥協, だきょぅ, 다쿄)하지 않고 울적한 상태로 지내는(おちこむ, 오치코무) 사람도 많다.
업무상 일본인과 함께 일을 진행할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 한국인 생각대로 빨리 일을 진행시키기 어렵다.
일전에 일본인과 일을 같이 한 한국인이 “일본인은 말로는 빨리 진행하자고 하는데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못마땅해(きにいらない, 기니이라나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
반면에 일본인은 별 문제 없다는 듯 일을 추진해 나가는 한국인을 약간 걱정스럽게 바라볼 정도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스타일이 다르므로 웬만해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
일본인은 완벽주의자가 많아 일 추진시한을 연장(延長, えんちょぅ, 엔쬬)하는 사람도 많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일을 시작할 때도 완벽하게 완성될 때까지 결과물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최초의 한걸음(一步, いっぽ, 잇뽀)을 쉽게 내딛지 못한다.
일본인은 무슨 일을 시작하든 여러 검토를 거친 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함부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럼 잔걱정이 많고 완벽주의자인 일본인을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데이터나 기획서라도 괜찮으니 눈에 보이는 검토 자료를 많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스케줄을 무리하게 잡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인에게 무리한(むりな, 무리나) 스케줄을 제시하면 예측을 잘 못하거나 결함이 많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미완성된 결과물을 완성품으로 제출할 수 없다. 한번 그런 일이 생기면 더 이상 함께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속도에 신경 쓰기보다는 일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인은 무리하게 짜여진 스케줄을 혹시 일을 적당히(いいかげんに, 이이카겐니) 처리하는 것은 아닐까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사람의 여유로움은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하려는 완벽주의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시계를 멈추고 본다. 꼼꼼하게 경우를 수를 따져보고 앞으로 닥칠 낯선 상황에 미리 대비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일단 일이 시작되면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기는 하는데, 속도보다는 디테일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좋게 말하면 철저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유연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꼼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국민성이 일본을 발명 왕국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국민성에 비춰보면 융통성이 없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일본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빨리빨리 문화로 일처리를 대충대충 하는 우리나라가 낳은 어처구니없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일을 진행하는 신중함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한번 곱씹어 볼 대목이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