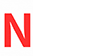세상에 근심·걱정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이 위장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거리를 걸으면서도 ‘걷다가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언뜻 보면 당신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과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의식은 끊기지 않는 흐름 속에 있다. 의식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몸과 마음에 깊이 배어 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의식은 ‘일’을 한다. 숨을 쉬고 내뱉는 일에도 관여한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은 물론 쉬지 않는다. 심지어는 누가 들쳐업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수면 상태에서도 내 의식은 깨어 있을 수 있다. 의식은 깊은 수면 속에서도 위험이 감지되면 어떤 형태로든 위험 신호를 보낸다.
특이한 것은 이 ‘의식’이 무책임할 정도로 수동적이라는 점이다. 불빛으로 말하자면 의식은 그냥 비추는 역할만 할 뿐 손발 걷어붙이고 현장에 뛰어들지 않는다. 길을 가다가 백합이 보이면 의식은 ‘그 백합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진 나’를 그냥 비춘다. 건널목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보면서 ‘긴장하는 몸’을 보는 순간 의식은 ‘긴장하는 나’를 비춘다. 그럴 뿐이다. 의식이 부모와 같은 존재라면 아마 호되게 야단 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당신이 흥분하거나, 위기에 처했거나, 비일상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식은 어김없이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본다. 안타깝게도 지켜보는 행위에서 그친다. 그런 점에서 의식은 자신에 대해 냉정하거나 담백하다.
나의 습관적 사유 방식이나 심리적·신체적 습관 또한 그 의식의 지켜보기 대상이다. 당신이 어떤 상황·어떤 사물을 마주하고 어떤 사유로 어떤 동작을 하건 의식의 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의식은 마치 나를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촬영하는 동영상 카메라와 같다. 당신이 살아 있는 한 의식을 따로 떼어 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의식의 활동 ‘알아차림’ ‘깨어 있음’
놀랍게도 자신이라는 존재와 따로 떼어 낼 수 없는 의식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 엄마와의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애라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의식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의식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에 몰입적으로 빠져드는 경우다.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두려운 나머지 패닉 상태가 됐을 때 그는 그 상황 자체에 함몰된다. 구조대가 오지 않는 조난자처럼 그의 심신은 몰입적 상황에 빠지고 만다.
대화 상대 앞에서 흐르는 물처럼 쉼없이 떠들어대는 사람, 한번 화가 나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술이 술을 마신다’라는 표현에 걸맞을 정도의 주당(酒黨), 손에서 모바일 폰을 떼어 놓으면 전쟁 중에 총 잃은 군인처럼 되는 사람…. 당신은 가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 혹시 이와 같은 상황의 빈도가 높아짐을 느끼는가.
‘알아차림’ ‘깨어 있음’이라는 언어가 우리 사회에 물결파처럼 번지고 있다. 이 언어의 중심에는 ‘의식 활동’이 있다. 최근 ‘내면소통’이라는 저술로 우리사회에 ‘과학과 명상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파해 준 김주환 교수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부지불식간에 스마트폰이 일반화됐듯이 얼마 가지 않아 ‘명상’ 또한 보편적인 현상이 되리라고 내다본다. 그런 시절은 종이에 물 스미듯 번져 온다. 의식이 무엇인지, 의식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존재인 당신에게도 이 흐름은 닥쳐 온다.
다시 첫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세상에 ‘근심·걱정’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이 지켜보지 않는 한 당신은 ‘네 가지 생각 중에서 세 가지’는 ‘근심‧걱정’을 하게 돼 있다. 우리 조상들은 ‘근심‧걱정’을 통해 살아남았으므로.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소위 파충류의 뇌라고 불리는 인류의 ‘원시 뇌’는 ‘두려움’에 기반한 온갖 ‘근심·걱정’을 양산하게 돼 있다. 이것의 물꼬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가 바로 내 ‘의식’의 활동성을 높여 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일이다. ‘알아차림’ ‘깨어 있음’이 바로 그 실천이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