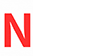1456년 무렵 구텐베르크의 인쇄 활자는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확산되었다. 1480년 100여 개에 불과했던 인쇄소가 1500년에는 260개 도시에서 1100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인쇄 활자는 지식의 저장과 확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고, 그것은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유럽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쇄 활자가 급성장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다. 그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판하는 팜플렛을 인쇄해 종교개혁을 주장했다. 특히 그가 번역한 신약성서는 발간 두 달 만에 초판 3000부가 모두 판매되고, 불과 3년 만에 8만6000부가 팔려나갔다. 더구나 라틴어로만 성서를 번역해야 한다는 규율을 어기고 독일어로 써서 지식 독점을 붕괴하는 효과를 배가시켰다.
인쇄 활자 확산을 촉발시킨 또 다른 요인은 로마가톨릭 교회가 주도한 ‘마녀사냥’이었다. 도미니쿠스 수도회 수사 슈프랭거와 크래머가 쓴 마녀사냥 교본 ‘마녀 잡는 망치(Malleus Maleficarum)’를 대량 인쇄해 배포한 것이다.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인증하고 서명한 이 책은 무려 28판까지 인쇄되어 유럽에 마녀사냥 광풍을 몰아치게 했다.
이처럼 모든 미디어는 양가성(兩價性·사랑과 증오 등 대립되는 감정 상태가 공존하는 심리적 현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른바 기술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낸다는 ‘기술 중립성’ 같은 것이다. 지난 한 세기를 지배한 신문·방송 같은 미디어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적 다양성을 신장시켰지만 종종 권위주의 통치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같은 첨단 기술로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 동영상들을 보면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기 힘든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사회 전체를 위협에 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술의 양가성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찬반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20세기 초 방송매체 등장 때도, 20세기 후반 정보사회 논쟁 때도 그랬다. 하지만 10여 년 전 이른바 ‘4차산업혁명론’이 등장할 때는 그런 논쟁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 일부 인문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은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내놓은 4차산업혁명의 현란한 미래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초지능 기술에 바탕을 둔 미디어 현상은 긍정적 측면보다 어두운 그림자가 훨씬 짙다. 심지어 몇 년 전 크게 문제가 되었던 ‘확증편향(자신의 가치관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편향된 인식 방법)’ 같은 문제들이 도리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정도다. 아마 지금의 기술 발달 속도라면 AI가 인간의 사고능력을 추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
)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책도 그렇지만, 이 기술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 갈등과 규제기구의 무력함이 근본 원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술의 사회적 정합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AI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거짓 정보의 위험성은 크게 걱정하면서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은 사실상 백지 상태다.
현재 첨단 미디어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글로벌 플랫폼들이다. 이들은 기존 미디어들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동시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양식의 콘텐츠들은 낡은 법·제도들을 조롱하듯 피해 가며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우리 미디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들도 경제 규제는 물론 내용 규제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
가짜뉴스든 반사회적 콘텐츠든 그 영향력은 온라인 플랫폼이 네트워크와 병목효과를 일으키며 나오는 것이다. 미디어 규제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난 3월 유럽의회가 구글·메타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공정경쟁과 반사회적 콘텐츠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을 의결하고 실제 조사에 들어간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일이 아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