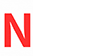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國葬)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위안부 합의 문제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일관계는 수출규제와 무역 보복 조치로 전례 없는 냉각상태다. 한일위안부 합의를 매듭지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 관계가 점화(點火)되면서 국장 반대 여론에 진땀을 흘리고 있고 윤석열 정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해탄 너머로 한일관계 개선에 신호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해법은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경계인으로 살아야 했던 재일조선인들의 삶과 애환을 그리고 있는 연극이 화제다. 일본 ‘이카이노’에서 오토바이 한 대로 삶의 생존과 차별을 견뎌내며 살아야 했던 재일조선인의 국경 없는 이념의 삶을 다루고 있는 연극 ‘이카이노 바이크’(김철의 작, 변영진 연출)가 코로나19에도 두터운 관객층들을 형성하면서 복원되어야 할 한일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무대배경은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 재일 조선인들과 재일 동포 한인들 집성 거주 지역이 배경이다. 오사카의 한인촌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백제 때부터 조선 유민들이 돼지를 사육하며 살았다고 해서 불리던 명칭인데. 일본인들의 지역 인식과 도시개발로 1973년도에 오사카 이쿠노쿠(生野區) 모모다니(桃谷)로 바뀌었다.

1922년부터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를 이어주는 ‘기미가요마루(君代丸)’ 정기 연락선을 타고 가야 하는 이카이노는 일제강점기부터 강제징용으로 떠나야 했던 뱃길이 되었고 1948년 제주 4·3 항쟁이 터지면서 생지옥의 죽음을 피해 달아나야 했던 눈물의 피난처가 됐다. 재일조선인 중 고향이 제주 출신이 많은 이카이노 땅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향 제주도와 고국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았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조선한반도는 남북의 이념으로 갈라지면서 이카이노 이주민 중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과 일본귀화를 거부하고 있다. ‘통일국적’을 갖고 싶다며 1945년 해방 이전에 일본에 거주하다 남게 된 재일 교포들은 조선 국적으로 일본 법률상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연극 ‘이카이노 바이크’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카이노에서 살아가는 재일 조선인 2~3세대들의 애잔한 삶을 따라가면서 제주 4·3항쟁과 한국전쟁, 스이타 사건, 일본 반전운동, 재일조선인 북송귀국사업 등 현대사의 장면들이 펼쳐진다.

이런 가운데 조선인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일본형사 쿠아타(장태민 분)가 고령으로 고국 땅(한국)을 밟는다. 조선학교에서 악으로 깡으로 단련된 명기(도예준 분)와 오토바이를 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으로 달리는 것으로 더 이상 통일의 땅으로 달리지 못하고 극은 끝나고 있다. 재일 조선인들 역사의 파노라마가 애환의 현대사로 그려지고 눈물과 웃음은 이 작품의 묘한 매력이 되고 있다.
연극은 진지하면서도 연극적인 장난기들이 변영진 연출의 ‘웃음 코드’로 무장된 가운데 이카이노 바이크는 삶의 과거와 현재를 향해 달린다. 무대는 극중 인물 ‘경우’(송광일 분)와 ‘수창’(탁상빈 분)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들의 비극성을 연극적인 장치와 개콘의 한 장면처럼 비칠 수 있는 웃음 코드를 장면으로 밀어 넣는다. 하지만 이들의 삶이 역사의 반환점을 돌고 이카이노의 바이크가 고향 땅을 달릴 때쯤에는 재일 조선인들이 달려온 눈물의 거리만큼 가슴의 전류로 흐르고 웃음은 감동으로 바뀌게 된다.

무대에 놓인 이카이노의 바이크는 재일조선인들의 삶이자 질곡의 역사이고 여전히 고향 땅으로 달려야 하는 현재로 되돌아온다. 무대에 고정된 오토바이를 타고 일본 땅에서 철을 훔치고 객기를 부리며 일본 경찰과 실감이 나는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에서는 청춘의 삶이 쇼트 파노라마처럼 무대에서 펼쳐질 때 관객들은 웃음을 터트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짠하다. 제주도가 고향인 수창이 북송선을 타고 북으로 떠나는 장면에서는 분열된 이념을 되돌아보게 하고, 여객선 앞에서 양반 갓을 쓰고 구전민요 ‘옹헤야’를 부르는 난장의 환영인파를 지나 세월이 흘러 희망의 북송선은 돌아올 수 없는 노년의 죽음으로 되어버린 수창의 편지에서는 먹먹해진다.
마지막 장면에서 더 넓은 고향 땅으로 달릴 수 없는 이카이노의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서 올드 팝송 ‘More Than I Can Say’가 흐른다. ‘전 당신을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그리워해요.’ 연극은 노랫말처럼 애환의 이카이노 바이크를 타고 돌아가야 할 재일조선인들의 삶과 비극의 애환을 배우들의 에너지 넘치는 연기와 연출의 감각으로, 실컷 웃으면서도 이들의 삶의 전류가 흘러 가슴은 시리고 재일조선인 역사로 한일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