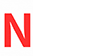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삼국사기’ 소지왕 기록이다. ‘15년(서기 493년) 봄3월, 백제왕 모대(牟大·동성왕)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다. 왕은 이벌찬 비지(比智)의 딸을 보냈다(百濟王牟大遣使請婚 王以伊伐飡比智女 送之).’ 우리는 이 기록을 신라-백제간 혼인동맹으로 이해한다. 이유는 ‘삼국사기’가 남긴 신라-백제간 유일한 혼인기록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혼인동맹은 왕실의 왕녀를 주고받는 혈연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상자체가 왕실여성이 아닌 귀족여성이며 또한 쌍방이 아닌 일방이다.
이찬 비지의 딸 요황
‘신라사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한다. <소지명왕기>이다. ‘15년(493년) 흑계 계유 정월, 국공(國公·지도로)에게 명해 비지의 집에서 군신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다. 장차 비지의 딸을 모대의 처로 한 까닭이다. 비지의 딸 요황(瑤黃)이 왕과 천궁을 용궁에서 알현했다(宴群臣于比智家 將以比智女妻牟大故也 比智女瑤黃謁王及天宮于龍宮). 3월, 요황을 부여(백제)에 보내 모대의 처로 했다(送瑤黃于扶餘妻牟大).’
비지(比智)의 딸은 요황(瑤黃)이다. 비지는 실성왕의 손자로 아버지는 비태(比太)이다. 비태는 미사흔의 딸 심황(心凰)을 통해 비지를 낳는다. 비지는 비록 방계이지만 엄연한 신라 왕실의 일원이며 골품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백제 동성왕과 비지의 딸 요황의 혼인은 신라-백제 왕실간 혼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동성왕이 혼인을 요청한 사유가 <소지명왕기>에 명확히 나온다. ‘14년(492년) 수원 임신 9월, 모대의 비 수기(首器)가 졸했다. 나이 29세다. 두 딸은 손아(遜兒), 운아(運兒)이고 아들은 도마(都馬)이다. 왕은 그녀의 죽음에 거애했다. 모대가 계혼(繼婚)을 청하니 조하에 명을 내려 알맞은 여성을 뽑도록 했다(牟大妃首器卒 年二十九 其二女曰遜兒運兒一子曰都馬 王爲之擧哀 牟大請繼婚 命朝霞采其可者).’ 동성왕은 요황과 혼인하기 한 해 전에 수기(首器)가 사망하자 이를 대처할 새로운 신라왕실 여성으로 요구한다. 수기는 누구일까?
신라-백제 혼인동맹의 오해
신라-백제간 혼인동맹의 효시는 서기 434년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이 체결한 ‘나제동맹’이다. 눌지왕은 비유왕의 요청에 따라 딸 주씨(주씨)를 비유왕의 비로 보내고, 비유왕은 여동생 소시매(소시매)를 눌지왕의 비로 보냈다. 이 성과는 474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벌전쟁 때 발현된다. 당시 자비왕은 지원군을 보내 고구려의 추가적인 남진을 억제했다. 이때 신라에 파견된 주씨 소생의 문주왕이 지원군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신라 보신(宝信)의 딸 보류(宝留)와 혼인했다. 이후 문주왕의 뒤를 이은 삼근왕은 또다시 보기(宝器)의 딸 수기(首器)를 비로 맞이했다.
문주왕, 삼근왕이 연거푸 단명하자 뒤를 이은 동성왕이 보류와 수기를 거뒀다. 동성왕은 지아비(문주왕·삼근왕)를 잃은 두 신라여성을 자신의 비로 삼는다. 동성왕이 계혼을 요청하게 된 계기를 만든 여성이 바로 삼근왕의 비이었다가 동성왕의 비가 된 보기의 딸 수기이다. 또한 소지왕은 추가해 지불로(智弗路·지증왕 지도로의 동생)의 딸 지황(智黃)을 백제에 보내자 동성왕은 지황 역시 비로 맞이한다. 이처럼 동성왕은 다수의 신라 왕족출신 여성을 비로 맞이하는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됐다.
반면 백제 왕녀가 신라에 시집간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으로 개로왕의 딸 보옥(宝玉)과 동성왕의 딸 보과(宝果)를 들 수 있다. 보옥은 아진종(阿珍宗)과 혼인하며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한 이사부(苔宗)를 낳았고, 보과는 법흥왕의 후궁이 돼 신라 화랑을 촉발시킨 사건의 주인공인 남모(南毛)와 화랑의 3대 풍월주 모랑(毛郞)을 낳았다.

신라-백제간 혼인동맹 고찰
결과적으로 동성왕이 맞이한 신라 비지의 딸 요황은 동성왕의 초혼(初婚) 상대는 아니다. 수기가 죽어 동성왕은 계혼(繼婚)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요황의 혼인을 또 하나의 나제동맹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삼국사기’가 이전 신라여성이 백제왕실에 시집간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요황의 경우만 달랑 남겼기 때문이다.
물론 요황이 동성왕의 비가 되면서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에 공동 대응했다. 이듬해인 494년 견아성(충북 괴산) 전투에서 백제는 신라에 군사를 보내 지원했고, 이듬해인 495년 치양성(황해 배천) 전투에서 신라는 백제에 군사를 보냈다.
‘삼국사기’가 쳐놓은 역사의 가림막이 너무 짙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