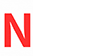화를 품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마음에 불이 났다’는 표현은 자연스럽다. ‘마음과 불’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 정도다. 불(火)이라는 현상 만큼 사람의 마음과 직관적으로 연관되는 비유도 드물다.
세상에서 즐거운 구경거리 중 하나가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 집만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불타는 현장은 엄청난 열기와 함께 귀중한 물건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게 마련이다. 그쯤 되면 어지간한 소방 행위도 속수무책이다. 속수무책은 대체로 당사자나 구경꾼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당사자와 구경꾼의 마음 상태는 현저히 다르다. 집이 불타고 있으면 그 집주인은 절망감에 휩싸여 죽고 싶은 심정일 터이다. 물건이 불타고 있으면 그 물건의 주인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라도 그것을 건지고 싶다.
그렇다면 구경꾼은? 구경꾼은 그보다 훨씬 다양한 마음 상태다. 자신의 집이나 귀중품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불행히도 구경꾼의 마음 상태 중 하나는 불난리를 축제처럼 느끼는 악마적 속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 집, 내 물건, 내 가족이 아닌 일은 말 그대로 ‘강건너 불구경’ 같은 심리적 거리두기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구경꾼의 불구경은 단순한 호기심·즐거움·자기 스트레스 해소 따위의 심리가 발동한다고 한다.
화마(火魔)의 양면성은 극단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내면 또한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여준다. 자기 자신에게 닥친 문제면 종이에 손가락이 베이기만 해도 온갖 부정적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치료에 집착한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의 일이면? 말 그대로 ‘강건너 불구경’이다. ‘그까짓 일이 무슨 대수라고!’ 하기도 한다.
타오르는 ‘불’로 비유되는 사람의 마음은 고전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성경’의 시편 102장 3절은 “내 마음은 불타오르고, 고갈될 것 같은 나의 육체는 참을 수 없이 아프다”고 표현한다. 대표적 불교 경전인 ‘화엄경’ 또한 “마음은 불길과 같아서 매개체 없이 다른 것에 옮아 붙기 때문에 지혜로운 수행을 통해 안정된 내면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다.
불의 성품과 사람의 마음은 같은 질량을 가진 물질과 비물질이 겹치는 현상과 같다. ‘음식과 건강을 위한 불, 주변의 온도를 높여주는 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불, 생명을 태우는 불, 물건이나 집을 태우는 불’이라는 뜻을 ‘음식과 건강을 위한 마음… 생명을 태우는 마음’ 등으로 표기 전환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불은 바람이나 주변 인화물질과 함께 타오른다. 불은 그 자체로 불이 될 수 없다. 마음 또한 마음 자체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주변 조건과 결합하거나 의존해서 드러난다.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와 연결된 타인의 행위‧생각‧감정들과 결합하여 마음의 불길이 일어난다.
문명의 시초에 불이 있었다면 그 불은 수십 만 년을 거쳐오는 동안 이제 인류의 마음속까지 그 속성을 고스란히 옮겨왔을까. 사람의 마음은, 알면 알아갈수록 한 존재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화물이다. 행복과 불행의 원리가 다른 무엇이 아닌 그 ‘마음의 불’의 운용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아마 집을 나설 때 무엇보다 불조심부터 할 것이다. 가스렌지나 전열기 등을 살펴보지 않아서 낭패를 본 기억을 한두 번쯤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명화된 시스템이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마음의 불은 발화 지점과 조건이 다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을 만나 어떻게 타오를지 모르는 게 마음의 불이다. 문명 발달로 인해 집이나 사무실처럼 외부적 시스템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마음의 불은 오로지 스스로 지켜보고 예방하거나 수습할 수밖에 없는 당신만의 내적 현상이다.
마음의 불은 시도 때도 없이 솟구치고 심리적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기도 한다. 이 장면은 당신이 가끔 구경해온 ‘엄청난 열기와 귀중한 물건이 검은 연기에 휩싸이는’ 화마의 현장, 그 이상이다. 왜? 종이로 손가락만 베여도 허둥지둥하게 되는 바로 내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다._()_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