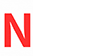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자기 인터뷰’는 타인에게 질문하듯 자신에게 묻는 일이다. 기자가 일국의 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심정으로 자신을 겨냥해 던지는 질문이다. “식사는 하셨느냐?” “건강은 어떠시냐?” “요즘 기분은 어떠시냐?” 모처럼 얻은 질문 기회에 이런 안부 따위나 묻는 기자는 없을 것이다. ‘자기 인터뷰’는 그보다 더 내밀하고 직설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겨냥하는 질문이다.
“요즘 양심에 꺼릴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나요?” “그 사람한테 이중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심으로 사죄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급에 눌려서 억지 춘향 하신 건가요?” “그 사건에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만 고백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하십니까?”
누구도 당신에게 저렇게 묻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관계의 파국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은 쉽지 않다. ‘자기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점이다. 저런 질문을 진정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나와 나 자신 사이에서뿐이다. 공공성을 띤 질문자와 질문을 받는 자의 입장이라 해도 그렇다. 누구도 이처럼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질문은 ‘해 주지’ 않는다. 왜? 그것은 철저히 당신의 삶이고 당신 몫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나 부정성에 대해 진솔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세상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의 기억과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들추지 않으면 밝아질 수 없다. ‘수치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치사하고, 서럽고, 부끄럽고, 허황되고, 음습한’ 내면의 염증 같은 것이 ‘자기 인터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자기 인터뷰’는 이것을 들추고 걷어 내는 작업이다. 아프지만 ‘자기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나에게 관심과 애정의 빛을 쪼여 주는 일
얼마 전 죽마고우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그 친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가 ‘급성 우울 증세’ 같다고 한다.
“병원은?” “갔는데, 약 처방만 받았어. 약 먹으니 너무 불편해.” 둘은 한 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주로 듣는 편이었다. 내가 말했다. “이거 어떤가?” 나는 ‘자기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별 기대는 없었지만 나로서는 다른 처방이 없어 보였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친구는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다. “좋아 보이네?” “응, 그래? 자네가 권한 ‘자기 인터뷰’ 그거, 멋지던데? 덕분에 내 속 마음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 나는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안 아팠어?” “아프긴 한데, 후련한 게 더 크더라구.” “아, 자네한테 그래도 힘이 남아 있었구먼!”
자기 인터뷰의 방법은 타인 인터뷰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자신을 제3자처럼 생각하며 심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준비 끝이다.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정도의 마음가짐이면 된다. 더 쉬운 접근법이 있다. 자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몇 가지 적어 보는 것이다. 곪은 상처를 째는 메스를 쥔 것 같은 심정으로 자신을 직시하면서 질문을 적어 보시라.
당신은 생각보다 ‘좋은 질문’ ‘심도 있는 질문’을 적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기억과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대외적으로 말하는 몸무게와 실제 몸무게는 차이가 있는가?” “최근에 거짓으로 웃었던 기억이 대강 몇 차례인가?”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가 나를 위해 일하는가?” 이런 질문을 착안하고 진솔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자기 인터뷰’는 구석구석 자기 사랑의 행위다. 당신의 내면을 어느 한 군데 서운하고 아쉬운 곳 없이 돌봐 주자는 제안이다. 미처 알지 못하여 스스로 관심조차 없었던 내 안의 잔인함·치졸함·비겁함·우울 따위를 향해 관심과 애정의 빛을 쪼여 주자는 것이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