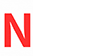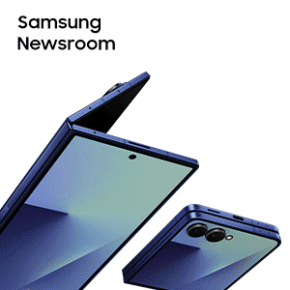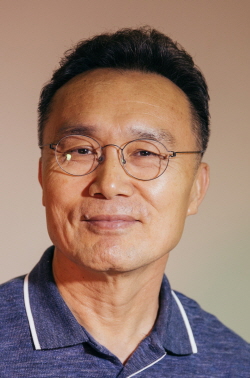
‘좋음’(goodness)을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두 영역, 예술과 종교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이 있다. 영역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 수도 있다. 예술이 본질적으로 인간 정신의 고양을 위한 활동이라는 믿음이 우리 시대에 와서 다소 흔들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수는 예술에서 많은 유익을 찾고 있다.
혐오스러움이나 추함으로 충격을 주는 양식들조차도 유익으로 귀결 혹은 수렴되곤 한다. 물론 이런 경우 일각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특수한 취미나 비즈니스일 경우가 더 많지만 말이다. 안타깝게도 예술에서 감각의 만족이나 의미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가치를 ‘현대’의 이름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자주 목격된다. 엘리트 계층에서 벌어지는 지적 허영심이나 기타의 경쟁력 차원의 행태가 필요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꿩 잡는 게 매’인 것은 불변에 가까운 진리이다. 예술 작품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넘어, 또 다른 플러스알파적 요인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전통문화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 때, 민화는 심미적 측면에 중요한 첨가 요인을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길상(吉祥)이라는 요소다. 심미적 소통과 만족을 주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기능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심미적 교감과 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서로운 일이 생기길 염원하는 모티브 말이다. 깊게 들어가면 도가적 세계관 같은 것들까지 소환해야겠지만, 보통은 신통력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종의 위약 효과(플라시보 효과)를 겨냥한 실용주의적 동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길상이다.

필자는 자필로 연하장을 보내는 세시풍속이 사라진 것을 항상 안타까워했다. 다분히 코믹한 모바일 이미지로 대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에게 복을 빌어 주는 동기는 여전히 미덕으로 남아 있다. 만약 내가 연하장을 직접 보내게 된다면 현대적 길상도를 선택하고 싶었다. 어떤 그림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작가가 있다. 바로 서양화가 최원숙이다. 전통 모티브로 가득하면서도 모던한 그래픽의 화사함을 만끽할 수 있는 최원숙의 페인팅을 연말연시 연하장 그림으로 쓰고 싶다는 에세이를 모 일간지 지면에 게재한 바 있었다.


초여름 연못 가득히 청초하고 싱그러운 자태의 연꽃들이 짙은 녹색의 넓은 잎들의 호종을 받으며 피어 있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굳이 정토적(淨土的) 서사와 연관 짓지 않더라도 한 해의 번성과 건강·화평의 기운을 빌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새해를 맞는 독자들에게 함께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취지로 ‘염원’이라는 작품 이미지도 곁들였다. 게다가 넉넉한 보름달 같은 달항아리 실루엣 안에 들어 있는 그 도상들은 그냥 우연히 조합된 그래픽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거기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과 정서가 흐르고 있음 또한 반가운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과거 버선 실루엣이 꽃 등의 화조와 매치되었던 것이나, 근작에서 달항아리 실루엣과 조합을 이루는 것이 비슷한 전통적 요소의 맥락으로 보인다.


길상적 도상들이 상서로운 기운을 환기해 내는 방식은 주로 대상들의 상징성과 관계되지만, 나아가 음양 등의 질서를 담아내는 것과도 관련된다. 항아리·꽃·나비·물고기·나무 등에서 음양 관계의 순환을 담고 있음이 엿보인다. 또한 작가의 풍경은 대체로 어떤 기억 속의 이상향일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알게 모르게 풍수지리의 일단을 엿보이게 한다. 어떤 기억 속의 인상적인 장소성 자체가 아늑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준 것이며, 그것 또한 지형 자체가 갖는 음양의 조화를 부지불식간에 투영시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최원숙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의 화면이 형태가 어떤 은유성이나 모호성보다는 조각적 명료성 같은 것에 기반하는 일러스트 풍의 양식을 띠고 있다. 은유적 수사가 짙은 아련한 스푸마토(sfumato·색깔 사이의 윤곽을 흐리게 해 자연스럽게 옮아가게 하는 명암법) 효과보다는 색 배합이나 자개 같은 오브제를 매치함으로써 간명하고 생기 넘치는 감각적 화면을 만들어 내는 걸 선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조합과 질서에 역점을 둠으로써 원활한 스토리텔링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작가에게 직접 들은 내용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다. 필자 임의로 향유자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독해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가 하고 묻는 시론적(試論的) 성격의 것이다. 필자가 길상도에 관심을 두고 미래 세대들에게도 전승되었으면 하는 것은 그것에 많은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길상도의 핵심은 이타적·공공적 가치에 있다. 작가 자신만의 이기적 복리가 아니라 타인들 혹은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홍익정신의 뿌리에서 나온 것일 수 있음에 주목하자. 민화나 다양한 시각문화 전반에 걸쳐 길상은 우리 공동의 관심과 가치를 압축하는 실용주의 미학의 터전이기도 하다.


‘길상도’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무병장수와 물질적 복·부귀영화·입신양명·안전·가문의 다산과 번영 등에 치우쳤다. 물론 오늘날이라고 우리의 욕망이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세속적인 까닭에 이 주제를 다루는 순간 작품이 판에 박힌 클리셰나 키치가 되어 버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시스템 면에서 생산자와 향유자가 모두 익명적 민중인 시대와는 분명한 차이를 지닌 세상에 살고 있다. 오늘날 생산자인 작가는 전문 엘리트이며, 향유자는 예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일정한 수준의 취미를 소유한 대중이다. 따라서 최원숙 작가의 경우도 전통 회화를 재해석하며, 보다 현대적 환경에서 향유될 작업의 생산 혹은 창출의 일익을 맡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작가의 그림은 ‘치유’의 동기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떤 기계적인 길상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필연적인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심미적인 완성도와 길상은 두 마리의 토끼가 아니라 심미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후자가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함은 자명하다. 향수 어린 심미적 서사 자체가 내면의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로 작동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꿈결 같은 이상향으로 초대하여 감정이 고상하게 정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지난해 ‘아시아아트쇼’에서 관객들에게 잘 어필되는 것을 필자는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다. (입춘을 맞아서는 작가의 작품 여백에 길상의 춘련(春聯)을 하나 곁들이고 싶다. 立春大吉 建陽多慶)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