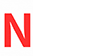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중국으로부터 기인한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중국 공산당은 국외로 눈을 돌려 해외 경제 침탈에 나섰다.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 침공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더 심각하다. 인접국가인데다가 산업 포트폴리오도 중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에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을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재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재앙의 진앙지는 공산주의의 이념에 따른 공동부유 정책이었다. 시진핑은 집은 주거대상이지 투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3도 홍선(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세워 부동산개발회사 헝다·완다·비구위안을 잡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GDP 25%에 상당하는 건설경기가 날아갔다.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날아간 것이다. 국가공산주의 나라인 중국에서 실업자가 발생하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중국은 대대적인 공급과잉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024년 중국 ‘공급과잉’이 일으킨 사건들
2021년부터 일어난 부동산 사태와 코로나19는 중국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생산을 해낸 것이다. 그러자 이것들이 재고로 쌓이며 헐값의 판매가 산업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국의 철강산업과 화학산업이 무너지고 각국의 중소제조업과 도·소매업이 파산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반도체와 AI 분야만 미국의 강력한 방어로 살아남을 뿐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 중국에 의해 타격을 받은 것이다.
공급과잉의 본질 ‘체제 공격’
자유시장경제는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는 개인 사유재산의 인정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에선 국가 전체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전체의 자금과 인원을 통제하는 거대한 국가가 개인들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유시장경제체제 속으로 한 개인으로서 들어와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는국가와 한 개인·한 기업 간 싸움이 시작됐다. 중국은 거대한 자금과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닌 초저가 공급과잉을 일으켜서 시장기능을 파괴해 버렸다. 이것은 공산체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룰 공격한 것으로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저지른 초저가 공급과잉의 본질이다.
세계경제의 재앙 ‘중국’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낮은 인건비로 어떤 제품이든 초저가 공급과잉을 일으켜서 한 산업군을 도태시켜버린다. 중국 정부는 무한대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40%를 생산하는데 그 대가는 달러로 들어온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기업들에게 위안화로 주고 달러는 모두 중국 정부가 소유한다. 중국은 어마어마한 외환보유국(3조2000억 달러·4200조 원)인데 이 자금으로 국유기업을 무한정 지원하고 공급과잉을 일으킨다.
중국 국유기업은 중앙국유기업 약 1만3000개·지방국유기업 약 3만1000개에 달한다. 2018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중앙국유기업은 연 500조 원의 이익을 낸다. 이를 5년 치만 모으면 대한민국 상장시장의 주식(2023년 시총 약 2450조 원)을 모두 살 수 있다. 이들 중앙국유기업은 중국 국가자산관리위원회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관리된다. 이들은 국가의 자금을 제로 금리에 가깝게 하고 무한대로 사용한다. 중국의 도농공은 월급 20만 원 이하가 6억 명(40만 원 이하·9억 명)이다. 이런 중국기업이 각 나라 개인들과 경쟁을 하며 세계경제에서 재앙을 일으킨다.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
공산주의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파괴하고 있다. 공산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가 한 공간에서 무한정 활동하면 안 된다. 자유주의라는 미명 하에 모든 산업을 중국에 다 내어주고 대기업의 낙수효과 없이 소비국가로 살아갈 수는 없다.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생필품은 자유경쟁에 맡기더라도 우리나라 기간산업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중국의 경체 침탈에 맞서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신속히 공론화 돼야 한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