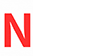루소포비아(Russophobia)는 ‘러시아’의 관형사형 Russo에 ‘혐오·공포’를 뜻하는 phobia를 이어붙인 1836년 신조어다. 자유론으로 유명한 J.S.밀이 당시 영국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서방·러시아 간 반목의 출발점으로는 동·서 로마 분열, 그에 따른 정교회와 가톨릭의 신학적 입장차, 19세기 패권을 둘러싼 영국과 제정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흔히 꼽힌다. 하지만 J.H.글리슨에 따르면 루소포비아는 선거에서 대(對)러 공포심을 이용하려 한 정치인들의 필요에서 기원한 것이다. 영국은 이 개념을 앞세워 발칸·콘스탄티노플·아프카니스탄·중동 등지에서 꾸준히 도발을 시도했으며 러시아는 늘 수세적·방어적이었다.
지난 3년여 러·우 전쟁을 통해 확인된 바, 서구인들에게 루소포비아는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다. 여기엔 오랜 러시아 멸시의 역사가 녹아 있다. 서구인들의 우월감이 아시아로 표출되기 전엔 슬라브 지역이 그 대상이었다. 러·우 전쟁 초기 평화협상 기회를 막고 항전을 부추긴 것도 영국 아니었나. 영어 ‘슬레이브(slave)’ 등 노예를 뜻하는 주요 서구어의 유래가 ‘슬라브(족)’인 점도 흥미롭다. 전쟁·약탈이 일반적이던 시절 노예는 흔한 현상이었으며, 산업혁명 이전 물질적 풍요는 사실 노예노동에 기반해 있었다. 어원을 살피면 누가 누구를 먼저 노예 삼았는지 알 수 있다.
근거가 희박한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의 팽창주의’다. 더구나 러시아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나폴레옹 전쟁과 나치 침공만 생각해도 서구 쪽에서 할 말은 아니지 싶다. 우리 사회는 루소포비아의 연장인 이런 개념·용어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 온 감이 있다. 6·25전쟁의 배후인 스탈린과 소련을 현 러시아와 동일시하는 것 또한 넌센스다. 1991년 소련을 자진 해체하고 연방공화국으로 거듭난 러시아는 서방의 벗들이 자본주의 사회로 이끌어 주길 고대했다가 10년간 비참한 상태를 겪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등장과 유가 상승에 힘입어 그럭저럭 나라 꼴이 수습됐다. 비록 권위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선거를 치루는 나라다. 소련 시대와의 분명한 결별이 공식 선언되기도 했다. 푸틴 체제가 공산당 부활을 사실상 막아 주고 있어 중국·북한과 한통속으로 보는 것도 지나친 시각이다. 에너지·식량 자급이 가능한 단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호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퇴임 후에도 트럼프주의는 지속될 전망이며 미·러 관계 역시 발전할 것이다. 기후 변화로 러시아엔 경작지가 늘고 북극해까지 열리기 시작한 마당에 루소포비아는 백해무익하다.
후원하기